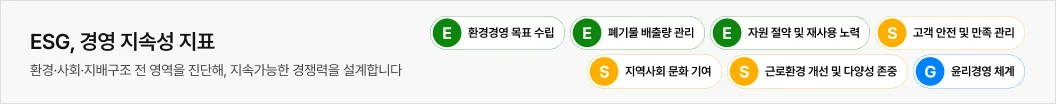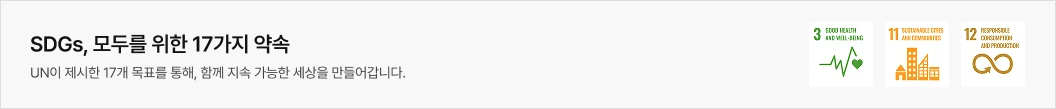LUSH : 페스티벌 공중화장실의 변신
2025-08-19

 CLAB PICK!
CLAB PICK!
페스티벌 화장실? 찝찝하고 불편한 공간, 어쩔 수 없는 건가요?
아니요! LUSH가 건드린 순간부터 이제는 다릅니다.
LUSH는 단지 향 좋은 브랜드를 넘어, 그 가장 소외된 공간마저 경험의 일부로 바꿔냈어요.
‘프레쉬 워시룸’은 샤워젤, 비누, 향수로 채운 향기 가득한 화장실로 탄생했고, 향기를 통한 힐링과 브랜딩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.
하지만 동시에, “이 즐거움을 어떻게 더 많은 페스티벌로 확장할 것인가?”라는 숙제도 남았죠.
| 기업명 | 러쉬코리아 (LUSH Korea) |
| 활동명 | 마음샤워 캠페인 – 프레쉬 워시룸 (Fresh Washroom) |
| 기간 | 2025 ~ 진행중 |
| 유형 | 브랜드 체험, 페스티벌 공간재구성, 감성 마케팅 |
| 핵심 아이디어 | 페스티벌 화장실을 단순한 시설이 아닌, 향기롭고 즐거운 경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브랜드와 관객의 감각적 연결을 창출 |
왜 화장실이 불편한 페스티벌의 상징일까?
긴 줄, 지독한 냄새, 지저분한 환경.
언제부턴가 페스티벌의 화장실은 ‘어쩔 수 없는 불편’으로 굳어졌습니다.
하지만 문제는 불편 그 자체가 아니라, 그 불편을 당연시해버린 관성이었죠.
LUSH는 이 순간조차 페스티벌 경험의 일부로 바꿀 수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.
“진짜 힐링은 무대 위뿐 아니라, 무대 사이에도 있다”는 시선이 탄생의 출발이었습니다.
화장실이 향기로운 힐링존이 된다고요?
‘프레쉬 워시룸’은 욕실이 아닌 작은 향기 체험관이었습니다.
카마·그래스·슬리피·더티 등 시그니처 향을 테마로 공간을 꾸미고,
샤워젤, 비누, 보디스프레이, 퍼퓸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게 했죠.
체취 걱정 없이 편히 공연을 즐기고, 비치된 거울 앞에서 셀카와 향기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.
짧지만 강렬한 브랜드 경험이었습니다.

(사진: 러쉬 코리아)
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, 경험을 움직이다
LUSH는 ‘청소’를 단순한 위생 작업이 아니라 경험 설계의 일부로 만들었어요.
5분마다 철저하게 청소하고, 여성 화장실 수 확대 등 세심한 설계도 병행했습니다.
거기다 ‘애프터 샤워 바’에선 글리터 미스트, 드라이 샴푸처럼 즉각 쓰기 좋은 제품을 배치해
향기를 넘는 ‘휴식과 위로의 시간’을 자연스럽게 제공했습니다.

(사진: 러쉬 코리아)
향기가 기억을 움직인다
공연장 밖의 순간이 오히려 공연보다 강렬하게 기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DMZ 페스트레인, 펜타포트에서 이어진 LUSH의 ‘향기존’은 그 증거였죠.
관객들은 “향기 덕분에 공연에 집중할 수 있었다”, “화장실도 추억이 됐다”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.
화장실이 불편의 아이콘에서,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무대로 변모한 것입니다.
작은 혁신,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
물론 한계도 뚜렷합니다.
행사마다 다른 공간 구조, 인력, 예산이라는 현실적 제약은 확산을 어렵게 만듭니다.
그럼에도 LUSH의 질문은 남습니다.
“어떻게 이 경험을 더 많은 페스티벌, 더 다양한 오프라인 현장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?”
CSR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. 불편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, 가장 소외된 순간조차 브랜드가 책임지는 경험으로 바꿔내는 것.